역지사지(易地思之)와 원문 서책
- 철학-문학-교양-상식
- 2025. 8. 22. 12:27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사회생활에서 이해부족으로 충돌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배려심이나 자비심의 한 예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까지 알아봅니다.
역지사지의 한자, 뜻, 원문이 나오는 서책, 이 말에 해당하는 이야기 등입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 그 입장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입장 바꿔 생각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두루미와 여우의 음식 대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음 등장 링크
역지사지(易地思之)는 한국에서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그 뿌리와 원문, 의미, 원문출처를 정리합니다.
1. 역지사지(易地思之) 한자와 풀이
易(바꿀 역) : 바꾸다, 대신하다
地(땅 지) : 자리, 처지
思(생각할 사) : 생각하다
之(갈지) : ~의, ~하다
2. 원문이 나오는 고전
이 말은 사자성어로 정식 기록된 고전보다는, 송대(宋代) 문헌에 자주 등장하며 점차 한자어 숙어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채근담(菜根譚) : 명대 홍자성(洪自誠)의 저술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라는 문맥에서 쓰입니다.
송운학 안(宋元學案) : 성리학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에서 “易地思之”라는 구절이 직접 확인됩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 고려 충렬왕 때 범입본이 편찬한 유학·불교·도교의 교훈서인데, 여기에 “역지관(易地而觀)”이라는 유사 표현이 실려 있습니다.
“易地思之”의 사상적 원형은 전국시대의 孟子에 보이는 “易地則皆然(자리를 바꾸면 모두 그러하다)” 같은 표현과
恕(推己及人)의 맥락에 닿아 있으나, 네 글자 성어 그대로의 문구는 송‧원‧명대 문헌에서 아직 확실한 예를 찾기 어려웠고, 공개 데이터베이스(위키문헌·CTP 등) 기준으로는 위 청대 주석서가 가장 이른 확증 사례로 파악됩니다. (다만 더 이른 판본·지방지·문집에서의 용례가 추후 발견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Chinese Text Project
원문 출처 링크(인용 근거)
陰隲文註 해당 구절(위키문헌): 문장 안에 “使以其身與其子女易地思之”가 직접 확인됩니다.
위키문헌
陰隲文註의 간행 근거(帝君書鈔, 嘉慶1518 10 간본 언급
3. 뜻이 적용되는 이야기
역지사지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들면: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
안회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쉽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식의 이해심이 바로 역지사지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설화 – 걸인과 부자
한 부자가 길에서 구걸하는 이를 업신여기자, 스님이 “다음 생에는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일깨워줍니다. 이것도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의 말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인간 본성이라 했는데, 이는 남의 처지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역지사지의 정신과 직결됩니다.
4. 현대적 의미
오늘날 역지사지는
▶인간관계(배려, 공감)
▶ 정치(상대 당의 입장 이해)
▶ 외교(타국 입장에서 사고)
▶ 경영(고객·직원 관점에서 접근)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사고방식으로 강조됩니다.
👉 정리하면,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송·명대 유학 문헌에서 널리 쓰인 표현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며, 명심보감·채근담 등에도 유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공자의 제자 안회나 불교 설화 등에서 그 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명심보감, 채근담, 혹은 송운학 안 속 실제 원문 구절 찾아서 원문과 해석
아래는 명심보감, 채근담, 그리고 송원학안 관련 고전 문헌 속에서 ‘역지사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실제 원문과 해석입니다.
1. 명심보감 (明心寶鑑)
원문은 아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 명심보감 존심 편(存心篇)에 나옵니다:
將心比心,便是佛心
장심비심, 변시불심
해석:
‘마음을 마음과 비교한다’ 즉, “다른 사람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비(慈悲) 로운 부처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한자(漢字) 이야기
명심보감에 직접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장심비심」이라는 표현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뜻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공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 채근담 (菜根譚)
3. 맹자: ‘역지사지’의 기원
맹자 《이루 편(離婁下)》에 등장하는 표현이 ‘역지사지’의 기원이 됩니다:
禹稷顔子易地則皆然
우직 안자 역지 즉 개연
해석:
“하(夏) 나라의 치수에 성공한 우(禹), 농업의 시조 후직(稷), 공자의 제자 안회(顔子)도, 서로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모두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즉, 처지가 바뀌어도 올바른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chinatogod.com
4. 송운학 안 (宋元學案)
이 책은 송·원 시대 유학자들의 인물과 사상을 소개하는 전기적 기록으로, 사자성어나 특정 구절 중심의 원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전 원문 해석
명심보감(존심 편) 將心比心,便是佛心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자비로운 부처의 마음
맹자(이루 편) 禹稷顔子易地則皆然 우·직·안회는 처지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
실제 “易地思之”가 처음 확인되는 중국 문헌 기록은 송대 이후이며 원문 인용을 합니다.
다음이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易地思之”가 중국 문헌에 실제로 문구 그대로 나타나는 가장 이른 사례(송대 이후)입니다.
清 朱珪(1731–1807) 陰隲文註의 帝君書鈔에 수록, 嘉慶15년(1810) 간행본으로 확인)
원문:
……使以其身與其子女易地思之,當不寒而慄矣……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음 등장
陰隲文註는 도교 윤리서인 文昌帝君陰騭文에 대한 주석서로, 청대 학자 朱珪의 주해본에서 “易地思之(역지사지)”가 현재와 같은 네 글자 성어 형태로 명시적 표현이 보입니다. 위 문구는 타인의 처지로 몸과 자녀를 바꿔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역지사지’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위키문헌
이 주해본이 1810년(嘉慶十五年) 간행된 자료에 수록되어 있음을 별도의 연구자료가 확인합니다.
易地思之(역지사지) 추가 메모
“易地思之”의 사상적 원형은 전국시대의 孟子에 보이는 “易地則皆然(자리를 바꾸면 모두 그러하다)” 같은 표현과
恕(推己及人)의 맥락에 닿아 있으나, 네 글자 성어 그대로의 문구는 송‧원‧명대 문헌에서 아직 확실한 예를 찾기 어려웠고, 공개 데이터베이스(위키문헌·CTP 등) 기준으로는 위 청대 주석서가 가장 이른 확증 사례로 파악됩니다.
Chinese Text Project
원문 출처 링크(인용 근거)
陰隲文註 해당 구절(위키문헌): 문장 안에 “使以其身與其子女易地思之”가 직접 확인됩니다.
陰隲文註의 간행 근거(《帝君書鈔》, 嘉慶15 [1810] 간본 언급):
연구 성과 요약. Acade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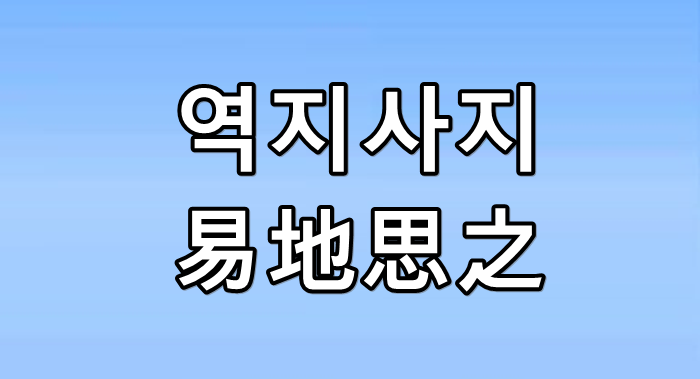
방패연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사찰 사명암 탐방(통도사경내) 통도사 사명암 탐방 영축총림통도사는 가보면 가볼수록 더 가보고 싶은 절 중의 절입니다. 세간에서 흔히들 최고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
omnislog.com
사마귀와 당랑거철(螳螂拒轍)
유월의 시골풍경. 유월 교와로 나가니 들판에는 보리 추수 계절입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가 심어진 논은 보리 추수를 한 후 모내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 보리 수
omnislog.com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듣는다,주언청야CCTV
주언작청야언서령(晝言雀聽夜言鼠聆). 주언청야CCTV요새는 낮이나 밤이나 어딜가나 CCTV가 다본다 !벽에도 귀가 있고 천정에도 눈이 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omnislog.com
이 글을 공유하기





